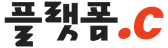키리시마 사토시의 죽음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교훈
2024년 4월 20일
지난 2024년 1월 29일,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활동 당시인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9년 간 수배 상태였던 키리시마 사토시가 사망했다.
2024년 1월 말, 49년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던 한 사람이 나타났고 곧 영영 사라졌다. 말기 위암 환자로 입원한 와중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경시청 공안부의 취조를 받다 사망한 그의 이름은 키리시마 사토시. 1975년 이후��로 체포를 피해 은신한 이후 생사도 묘연했던 그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 “전갈” 그룹의 대원이었다.
2020년경 김미례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그룹들은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 (다시) 알려졌다. 그들은 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로부터 일본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스스로를 끊어내고자 투쟁했다. 그들이 1970년대 투쟁 방식으로 선택한 폭파를 비롯한 무장투쟁은 지금까지도 논쟁적이다. 당시의 무장투쟁은 독일을 비롯하여 68운동을 통해 발흥한 신좌익이 대중운동의 퇴조 국면에서 도시게릴라를 비롯한 무장투쟁을 선택했던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다. 아울러 베트남을 비롯해 탈식민 과정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장투쟁이 광범위하게 발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의 연속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사옥 폭파는 의도와 다르게 많은 사상자를 냈고, 이후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그룹의 대원들은 수감 중에 무장투쟁을 절대화하며 투쟁하지 않는 시민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평가했던 바 있다.

키리시마는 사망자를 낸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투쟁에 관여하였던 바는 없다. 그가 “전갈” 부대로서 개입한 투쟁은 세 차례의 ��기업 폭파 투쟁이었다. 패전 이전 조선인 및 중국인 노동자들의 착취와 학살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전후에도 동남아 등으로의 신식민주의적 진출로 이윤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헌법 국가’를 가장하며 전쟁과 착취로 가속적 성장을 이룬 일본의 현실 앞에서, 키리시마와 “전갈” 그룹은 사상자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상징적인 폭파 투쟁을 감행한 것이다. “전갈” 그룹의 대표적 투쟁은 3개 그룹의 합동 투쟁이었던 하자마구미 본사 빌딩을 폭파한 ‘키소다니(木曽谷)-테멩고르(Temengor)’ 작전이었다. 이는 말라야 연방에서 ‘전범 기업’이 수주한 댐 건설에 대항해 선주민과 농민들의 게릴라 투쟁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후 키리시마는 ‘대지의 엄니’ 그룹이 벌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 투쟁에 협조했다. 이는 남한으로의 일본 기업 진출이 패전 이전의 식민주의적 모순과 한국에서의 노동착취를 가속화할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벌인 투쟁이었다.
학생운동 출신으로 불과 몇 년 동안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활동 이후 49년 동안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은신했던 키리시마의 죽음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DNA 감식을 통해 그의 신원이 사후적으로 확증되자, 공안부의 관계자는 "그대로 조용히 죽어버리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으로 자칭한 것은 자기 현시욕“이라며 경찰의 떨어진 신망을 감추기 위해 망자에게 극언을 퍼부었다. 경찰의 말을 받아쓰며 ‘테러리스트’의 죽음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뽑아내는 주류 언론은, 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폭탄을 들었는지, 키리시마를 ‘테러리즘’으로 단죄해온 국가는 전쟁�과 학살 속에서 어떤 폭력을 자행해왔고 또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주류 언론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볍게 긍정하는 태도도 미간을 찌푸리게 하긴 매한가지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굳이 ‘반일’을 내건 것은, 훗카이도 아이누인들에 대한 내부적 식민화로부터 전쟁과 전후의 경제적 확장으로까지 일본이 걸어온 역사에 대해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성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자행하는 폭력과 착취엔 무감각한 채로 어깨를 으쓱하며 ‘양심적’이고 ‘친한’적인 일본인도 있었다고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비록 일본 자본과 한국 자본, 그리고 한국 노동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았다는 한계는 있지만, 남한의 코오롱과 일본의 토레이 사이의 관계를 짚은 기관지 ”복복시계(腹腹時計)“ 특별호 2권의 한 대목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일제로부터 차관을 빌려 일제에 금리를 지불하고, 일제로부터 기계설비・원료를 구입하여, 남조선 노동자(특히 유년공・여공)를 초저임금으로 철저히 착취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일제본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 현재의 남조선 섬유산업의 기본구조이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 봤자 그 이익은 일제 침략기업과 박(朴) 독재정권의 일부 특권층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고, �일제 침략기업 하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남조선 노동자들은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 토레이는 이와 같이 악독한 착취수탈을 자행하는 일제 침략기업의 대표적 존재이다.“
자국의 기업이 지닌 책임성을 읽어내고, 현지 당사자들의 투쟁과 호응하는 의미에서 질주하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멈추려는 자세는 오늘날에도 깊은 영감을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이토츄 상사를 규탄해 끝끝내 그 연쇄의 고리를 끊어낸 일본 청년·학생 활동가들의 모습은 그 책임성의 감각을 떠올리게 만든다. 얼마 전 ICA(국제협력기구)가 ODA(정부개발원조) 차원에서 융자를 제공하고 스미토모 상사 등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수주하여 방글라데시에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일본의 급진적 기후정의 운동가들이 이에 대항하는 운동을 조직한 적 있다고 한다. 비용을 주변부로 외주화하는 탄소 자본의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모습에서, 댐 건설에 저항한 말레이 선주민과 이에 호응해 싸웠던 70년대의 일본인들을 자연스레 떠올린다.
과거의 투쟁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청산주의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당시의 투쟁을 낭만화하거나 성찰과 반성을 숨길 필요도 없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의 생존자들은 때로는 일용직 노동시장에 은신하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 팔레스타인 투쟁현장에 머물면서, 때로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세상과 이어주는 지원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얇은 선을 유지하며 49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평화와 생명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관계에 대해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술회하곤 했�다. 누군가의 투쟁이나 정신을 ‘계승’할 필요는 없지만, 폭력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면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지점들에서 키리시마가 남긴 문제의식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이어지는 현장들에서, 팔레스타인의 비극에 공모하고 있는 한화와 두산과 이토츄와 아마존을 규탄하는 자리들에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 던진 물음을 다시 받아안고 있다.

글 : 이재현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