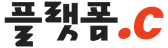우리의 파업 보도가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
2022년 12월 31일
9년 전 철도노조 파업 때의 일이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최장기 기간인 22일 간 파업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노조 간부 몇 명을 잡겠다며 경찰병력 4천여 명이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 얘기하지 않았다. 마치 복싱 중계방송처럼 노조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는, 짐짓 근엄한 태도로 ��현상을 설명할 뿐이었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기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데 대다수 언론이 ‘충실’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파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는 곳은 드물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9년이 흘러 그들의 파업 상황을 보도해야하는 책무가 생긴 나는 화물연대 파업을 취재하면서 자주 자괴감을 느꼈다. 왜 언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파업 현장은 언론을 비롯한 기자들에겐 기사를 쏟아내야 하는 ‘밥벌이 현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부가 합의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작된 화물연대의 두 번째 파업을 둘러싼 보도는 첫 번째 파업 때와 확연히 달랐다. 두 번의 파업 사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부의 대응 태도였다. 모두들 알다시피 상식을 넘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화물연대를 탄압했고, 그게 정확히 ‘먹혀들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오도가도 없이 그들의 ‘파업’으로 우리 산업 피해가 ‘몇 조원’대에 달하는지, 시멘트와 원유 업계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집중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화물차 기사가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운송에 따라나서는 언론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갈등을 키우는 보도에 모두가 ‘충실했다’.
그럼 기자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 내가 보기엔 동료는 대부분 성실했다. 부장과 팀장은 충실히 조간과 통신사 기사를 아침부터 오후 내내 모니터 하고, 거기에서 적당한 ‘야마’(주제)를 뽑아서 현장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린다. 예컨대,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이런 식이다. “오늘 파업 ㅇ일차인데, 어디 산업현장 피해 섭외되는 곳 있는지 알아보고. 화물연대 반응은 뭔지 이렇게 두 꼭지 해보자. ” 기자들도 지시대로 충실히 움직였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여부나, 파업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태도 등은 뉴스거리에서 그렇게 멀어졌다.
결국 방향성의 문제다. 내가 이 뉴스를 하면서 ‘왜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일단 처리하고 본다’의 업무프로세스가 되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것 같은 뉴스가 탄생한다. ‘팩트’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뉴스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빠져있다. 그런 뉴스는 결국 정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취재하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발제했나? 데스크를 설득했나? 자문해보면, 둘 다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안에서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거나, 한쪽에 치우친 기자라는 평가를 들을까봐 눈치 봤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다. 물론 가끔씩 방송이 아닌 글로 쓴 기사가 좋았다고 응원해주는 동료들의 힘으로 발제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취미로 복싱을 오래 해 온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역시 기자생활 중이다.) 차라리 권투 시합은 체급이라도 맞춰서 경기하니까 공평하기라도 하다고. 그런데 체급이 다른 둘을 링 위에 올려놓고선, 불공평한 조건을 얘기하기보다 왜 체급을 못 키웠냐고 진사람 탓하는 게 언론인 것 같다고. 크게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었다. 파업 보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느낀다.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그들이 파업에 나섰던 노동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해가 저물고 있다. 결국 응축된 문제들은 언젠가 터져 나오고 말텐데, 그때 우리 뉴스룸은 어떤 자세를 취할지. 또 근엄하게 정부에게 책임만 물을 것인가. 그 물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부를 향해야한다. 우리는 파업 보도를 정말 ‘잘.해.왔.는.가.’ ✒️
글 : 언론노동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