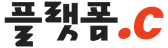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복지의 이름으로 상업화?”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 외주화의 문제
2025년 9월 12일
‘복지관’의 상업 공간화
한양대학교 학생복지관인 한양플라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생활과 복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교내 식당에서 저렴한 한 끼를 해결하고, 복사점과 사진관에서 과제를 준비하고,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캠퍼스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2015년, 위탁업체에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공간은 점점 상업적 논리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31일, 10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학교는 새 운영사를 선정했고, 새 운영사는 ‘고품격 F&B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퇴거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공간이 ‘수익 창출의 장터’로 변질되는 상황에 분노하며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원임대차–전대차의 ‘분절’
사태의 핵심은 원임대차와 전대차 구조, 즉 외주화 시스템이다. 학교는 전체 공간을 민간 운영사에 임대하고, 운영사는 개별 상인들에게 다시 점포를 빌려준다. 상인들의 계약 상대는 학교가 아닌 운영사이므로, 운영사가 바뀌면 상인들의 권리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리모델링 비용과 매출 수수료 인상도 운영사를 통해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결국 학생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 이 구조는 학교가 결정권은 가지면서도, 책임은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원청 기업이 하청을 내세워 노동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주의 외주화 구조와 다르지 않다. 복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변화 뒤에는 수익 창출과 책임 전가라는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이 자리한다.
학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의학과 재학생 이서연 씨는 “누구나 5,5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인데, 왜 ‘고품격’ 공간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일상적 식사와 휴식의 공간’, ‘저렴한 가격’이 최우선 가치로 꼽혔으며, 상업 활동 확대를 원하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양플라자만의 상황이 아니다. 한양재단은 지난 수년간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은 축소해 왔다. 학생들은 이미 교육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학교가 복지 공간마저 상업화해 임대료 장사에 나서는 모습은 학생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공간에서 다시금 돈벌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상인들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이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18년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길선영 씨는 기자회견에서 “학교와 새 운영사는 기존 상인과 단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프랜차이즈 위주의 재편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부담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캠퍼스 공동체의 생활을 함께 꾸려 온 구성원이다. 그러나 전대 구조 속에서 이 관계는 한순간에 지워진다. 이는 자본주의적 계약 질서 속에서 ‘인간의 관계’가 ‘계약 관계’에 종속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개입찰 절차를 강조하며, 임대 수익은 전액 학생 복지에 쓰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 사립대학이 교육용 재산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연간 1천 2백억 원이 넘고,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수익금은 평균 32억 원 규모이지만, 대학들은 이 수익금이 교비로 쓰인다고 밝힐 뿐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수익사업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해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익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시켜 입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은 줄인 채, 다시 임대료 장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합법성’은 강조되지만, 삶의 안정성과 공동체적 신뢰는 부차적으로 취급된다.

‘외주화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외주화 구조는 자본주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위험 전가’의 논리다. 원청은 결정을 내리고 이윤을 챙기지만, 비용과 위험은 하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대학 역시 같은 구조를 따른다.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는 상인에게, 가격 상승은 학생에게 전가된다. 등록금으로 이미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화가 대학을 잠식하는 전형적 사례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부동산 운영과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 학생들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 개선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상업화 논리를 넘어서는 공공성의 보장이다. 상인들에게는 재계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식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한양재단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라는 이중적 행보를 중단하고, 수익 구조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사회의 역할: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로
이번 서명운동은 학생사회가 단순한 소비자의 위치를 넘어, 대학 시장화에 맞서 주체로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다시금 임대료 수익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생사회가 자본주의 논리를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캠퍼스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학교는 합법성과 절차를 강조하지만, 학생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성은 종종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교육기관은 절차적 합법성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삶의 형평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양플라자 사태’는 우리에게 묻는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을 줄이며, 공간마저 임대료 수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 과연 교육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학생복지관��은 ‘수익의 장터’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공동체적 신뢰가 깃든 공간이어야 한다. 한양대가 진정으로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려면, 자본주의적 상업화 흐름을 끊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글 : 최준서 (한양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