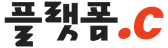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 정책의 내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종료된지 774일만에 우리��는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 농성의 요구는 간단하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통령이 다시 답변해달라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만 남발하고 계획은 없는 복지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 아닌가. 대통령이 답변하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고난 뒤 관련 법안 처리에 묵묵부답이다. 법이 개정되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복지부의 중장기 예산계획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반영되어있지 않다.
생계,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보수언론을 비롯한 복지확대의 비판자들은 ‘수급자 수가 500만명에 이를 것’,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칠 것’ 이라고 우려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제정이래 160만명, 인구의 3%내외를 왔다갔다 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며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빈곤층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되는 평균 급여는 가구당 12만 5천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수급자 숫자는 24만명이 늘었다. 물론 애초 60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적었다.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는 넓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만명, 의료급여는 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빈곤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면한 소득보장, 생계급여다. 이들 중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갈 도리가 없다. 의료급여는 빈곤층 중 가장 취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두가지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오래도록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마련될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안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싣겠노라 했지만, 얼마전 그 계획은 교묘히 수정되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만 넣겠다는 것이다. 2차 종합계획안에 담긴다 해도 이것이 이행되는 시간은 3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만을 폐지하는데 향후 4년의 시간을 소요하겠다는 이 계획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다.
복지부는 몇가지 완화 방안을 앞세워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적 사례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이런 몇차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19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경험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계획이 지난 여름 관악구에서 일어난 모자의 아사사건,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에 의한 가족살인이 일어난 직후 발표된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부양기준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복지부의 이런 발표는 두꺼운 보도자료 속 정책 상세설명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을 뿐이라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각자의 일이 되어버린다. 또다시 누군가의 죽음이 발생하면 사건이 될 뿐, 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다. 언론조차 주목하지 않는다.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빈곤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넘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는 치열하지 않은 세상을 향한 농성장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선언은 반복했지만 계획은 내놓지 않고 버티는 복지부와 대통령, 책임자들을 향한 곳이다.
어떤 이야기가
그것이
너무 많이 이야기된 것이므로
거의 일종의 죄악이라면
그것은 어떤 시대인가?
<나무없는 나뭇잎 하나>, 파울 첼란
오랫동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다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십수년만에 부모님께 닿는 연락이 ‘수급신청’때문일 수 없다며 복지신청을 미뤄두고 노숙생활을 전전했다. 지난해 그는 수급자가 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덕분이 아니라,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님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난이 부끄��러워 장례식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오롯이 그의 몫이 되었다.
부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법과 제도는 재빠르게 논의되고 손질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는 언제나 그 순위가 늦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은 빈곤문제 해결을 선언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당신은 생존을 미룰 수 있는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단말인가.
청와대는 응답하라.

글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