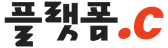발전 비정규직과 정의로운 전환
누구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전환은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에 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핵심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에만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작년 8월까지 허가받은 77개 해상풍력발전 용량의 92%도 민간사업자의 손에 쥐어졌다. 1기가와트(GW)당 6~7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에 2030년까지 100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기업은 이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 20년 동안 전기요금과 보조금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민자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과 해외기업이 대거 진출하고 국내 대기업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거 민영화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윤을 좇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면서, 햇빛과 바람과 같은 무상의 자연자원을 사업자가 사유화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설 투자비가 가장 낮은 곳, 즉 토지 비용이 적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농지를 강탈하는 일이 늘어나자 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풍력 사업도 생태계 파괴 논란을 낳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지어져 저주파 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긴다. 해상풍력도 생태계 파괴와 어업권 논란을 낳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고 지불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뤄질 전환에서 핵심 문제다. 주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장악된다면 민영화로 높아진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전환이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기업의 부를 채워주는 과정이라면 전환의 정당성도 훼손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14일 47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을 발표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을 통해 계획적이고 정의롭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개로 쪼개져 경쟁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통합 한국발전공기업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내년부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재배치할 수 있다.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 후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다.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근거하고 있다.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헌법 제120조 1항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바람과 햇빛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력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커다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민영화의 다른 이름) 이후에 고착되어 발전해온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에너지 전환을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하려면, 공공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구준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