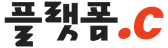하자라족 난민 샴스는 왜 인도네시아 구치소에 10년이나 갇혔나
2023년 9월 17일
이 글은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세상이 바뀐다"는 모토로 28년 동안 발간 중인 월간 『작은책』 10월호에 실렸다. 편집부의 동의 하에 공동 게재한다.
하자라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시아파 계열의 소수민족이다. 파키스탄과 이란, 그밖에 유럽 등에서 난민으로 이주한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외모는 위구르족이나 카자흐족 등 투르크계열과 비슷해 칭기즈칸 시기 이곳까지 진출해온 몽골족의 후손으로 여겨지지만 언어는 페르시아어 방언으로 분류되는 하자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됐든 그들의 종교적이고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수니파가 다수인데다 다수가 파슈토어를 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언제나 소수민족일 수밖에 없었다.
하자라족 청년 샴스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즈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공동체 사람들의 안전히 점차 위협받는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탈레반은 그와 가족들이 살던 터전을 위협했고, 병원이나 학교도 안전하지 않았다. 가령 2020년 5월 어느날 카불에서 벌어진 한 참사는 특히 끔찍했다. 시내 한복판의 병원에 들이닥친 탈레반 괴한들은 16명의 여성과 2명의 아이를 살해했다.
열여섯 샴스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살아남으려면 남아있기 어려웠다. 2013년경 그는 작은 교실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탈레반을 신봉하는 누군가가 이를 신고했다. 극단적인 원리주의 시아파인 탈레반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었고, 심지어 서방 문화인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더더욱 이교도적인 행위로 간주됐다. 이런 일로 인해 샴스는 납치와 살해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고향에서 도망치는 것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서쪽으로 향하기도 했지만, 샴스는 동쪽으로 향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말레이시아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였고, 수니파가 시아파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처럼 극단주의 만행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 최근들어 이따금 종파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종교의 자유가 용인되는 나라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열여섯 샴스는 곧바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망명 신청서를 쓰고, 자카르타에 정착할 곳을 구할 동안, 난민협약에 따라 임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난민판무관 사무소는 그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 대신 인도네시아의 형사기관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다. 그곳에 가면 국제이주기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샴스는 아직 열여섯이었고, 부모님의 생사는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어렵사리 챙겨온 돈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술라웨시섬 북부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실에 자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16개월 동안이나 구금됐다. 이 기간동안 그는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고, 물이 없어 샤워조차 거의 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았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열악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니,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
1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이민국 사람들은 샴스를 칼리만탄 서부에 위치한 폰티아낙 구치소로 송치했다. 이미 그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폰티아낙 구치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암흑으로 뒤덮인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샴스를 비롯한 난민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유엔 난민당국은 그에게 죄수의 삶을 강요했다. 그와 다른 난민들이 갇힌 방은 24시간 내내 잠겨 있었고, 온종일 뻥뚤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018년 6월, 샴스는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리아우섬에서 가장 큰 도시 바탐에 있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쉼터였다. 감옥을 떠나 처음으로 가는 감옥이 아닌 공간이었지만, 이곳도 구치소와 별 차이가 없었다. 난민들에게는 공부할 권리도, 노동할 권리도,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할 권리도, 은행 계좌를 갖거나 여행을 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쉼터에는 오후 9시라는 통금 시간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됐고,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넘겨 외출할 수 없었다. 만약 어길 경우 독방에 수감되고, 추방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샴스를 비롯한 난민 동료들은 서로 돕고 함께 일했다. 예를 들어 바샤르는 이란의 한 공장에서 8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요리 재능이 꽤 탁월했는데, 오랫동안 구치소와 쉼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다. 샴스의 또래 친구인 청년 난민 하자드 역시 샴스처럼 탈레반의 살해 협박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난민이었다. 그는 밀가루 반죽에 아주 능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낙천적이었다. 5년에 가까운 죄수 아닌 죄수의 시간동안 샴스가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샴스는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간신히 수인의 시간을 끝냈지만, 여전히 난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고향에서 5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고향에 남은 하자라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을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와 행진 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한 해시태그 #Justice4Hazara 운동을 통해 하자라족의 평범한 사람들이 처한 반인권적 상황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난민은 1억1천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퍼센트 남짓에 그친다. 샴스와 같은 하자라족 난민은 한국에도 있다. 청년 샴스에 연대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고통과 소외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가 더 많은 난민 수용률을 보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들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으로 남아선 안 된다.
정리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