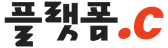건설노동자인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것
2023년 7월 31일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양회동 열사의 마지막 말씀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 다른 활동가들의 말처럼 노동자로서, 노동운동가로서 그의 긍지를 기억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두운 면이 있다. 우리 아빠는 건설노동자이다. 나와 동생들은 의도치 않게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려 느닷없이 얻어맞은 적이 많다. 도통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아빠의 자존심은 때로 복지 혜택을 거부하는 식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시행 전, 학교에서 급식비를 자주 미납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면제 신청서��’를 써 오게 한 적이 있다. 양 부모의 사인이 필요했는데, 아빠는 사인을 거부하며 “경은이 밥값은 아빠가 낸다”라고 꼬장을 부렸다.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자존심이라 생각했던 나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회동 열사의 그 말을 보고 다른 생각보다도 ‘그놈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다. 도대체 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열사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압이 극심해짐과 더불어 건설노조의 운동이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노조원들에게 할당되던 일감을 끊었고, 매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원 및 간부들이 추가로 기소, 구속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세훈 교육선전국장은 지난 35년간 건설노조가 이뤄 온 변화와 열사 사망 후 상황을 전했다. 조합원 워크숍에서 모둠별로 색지를 나눠 주고 건설노조가 생기고 내 삶에서 변한 것을 그림과 말로 표현하게 했을 때다. 많은 모둠에서 공통적으로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을 수 있다”, “반말을 듣지 않게 됐다”라는 말이 나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업체 직원이 조금만 수틀리면 ‘아저씨’, ‘기사님’ 하던 호칭을 ‘야’, ‘인마’, ‘이 새끼’로 바꿔 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노조가 확보하던 일감이 끊기자 조합원들은 기존의 도급팀으로 돌아갔다. 한 조합원이 저녁에 짐짓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 오랜만에 욕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사무실에 똥물을 뿌려 가며 받아 내고 근절했던 체불 임금도 다시 쌓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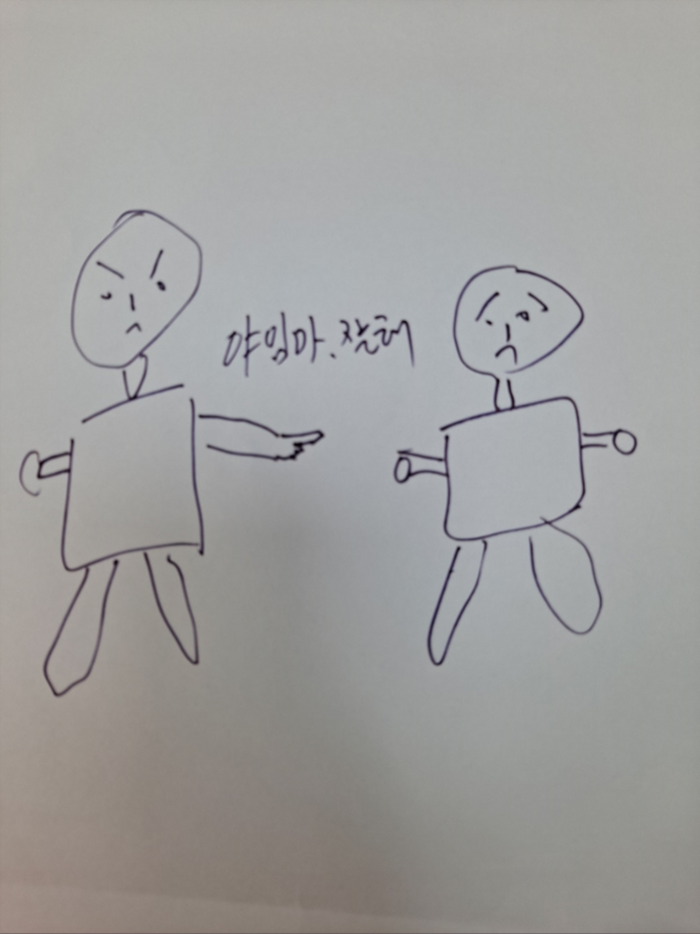
지난 5월 15일에 열린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의 1차 쟁점 토론회, ‘사회운동의 장소로서의 노동’에서 최민 활동가는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이 노조를 낙인찍고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며 그 예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매도하는 것을 꼽았다. 이에 덧붙여 박상은 활동가는 노동조합 탄압의 타깃으로 건설노조가 꼽힌 것은 노사 관계가 없던 업종에 노사 관계를 만든, 변혁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그 20년간의 전력 조직화 기간 동안 사회운동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는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분노, 슬픔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강하게 느꼈다. 나는 왜 사회운동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8시간 노동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알기는커녕 상상하지도 못했을까. 더욱이 내 부모의 일을. 나조차 건설 노동이란 그런 처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몸을 쓰는 노동, 그러니까 대상에 신체가 직접 맞닿는 노동이 지식과 전산으로 추상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창조’하는 노동에 비해 천대받는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고 친해지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아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일은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포럼이 끝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광주 본가에 갔다. 아빠는 야간 작업을 해야 해서 자정 넘어 귀가한다고 했다. “아빠는 프리랜서니까……”라고 엄마가 설명했다. 엄마는 불을 �끄지 않고 아빠를 기다렸고 나는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서울로 가야 했다.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자 엄마가 따라 일어나 아빠를 깨웠다. 둘러 앉아 강아지 재롱을 잠깐 보다가 집에서 나왔다.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 아빠에게 묻고 싶었다. 아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아빠한테도 인마, 새끼라고 부르는 개새끼가 있었는지……. 이번 월례포럼에 참석하게 된 데는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는 아빠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내가 느끼는 이런 혼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의 자존심이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무서워만 하지 않고 바라보고 싶었다. 쓸데없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대화 주제로 삼기 어색했던 가족과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은 척 꺼내 놓고 싶었다. 딸이 아닌 나로서 살고 싶어서 단절한 유년기와 가족을 어떻게 지금의 삶과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엮여 있다.
서경 (플랫폼c 회원, 교육공동체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