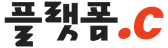사회보험의 뿌리 흔드는 실업급여 개악 시도
2023년 7월 30일
‘복지여왕’에서 ‘시럽급여’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편리하고 역사적인 길은 제도의 수급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엔 ‘복지 여왕’이 있다. 197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였던 레이건은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부정 수급을 받고,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흑인 여성, ‘복지 여왕’에 대해 말했다. 결국 그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발언��은 보수파를 결집시켰다. 복지제도와 그 수급자가 성실한 유권자들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프레임은 힘이 세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의 ‘대국민 보고서’일 것이다. 그는 2006년 10월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제출하며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며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썼다. 연간 4조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급여가 방만하게 운영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되게 비판했다.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지만, 복지부는 일부 부정수급사례에 돋보기를 맞춘 보도 자료를 쏟아냈다. 이듬해 의료급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되며 의료급여 환자의 급여 일수와 의료이용을 감시, 통제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이 프레임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22년 1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곧바로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보험료에 비해 사용한 급여가 적어 재정 수지가 한해 5천억 이상 흑자라는 반박에 부딪혔지만, 이주민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번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왔다. 웃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온다,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등 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말이 공분을 샀지만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위험 대응의 제도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뉜다. 이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은 가입 여부다. 공공부조는 누구나 가난에 빠지거나(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이 되면(기초연금)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와 수혜가 연결되어 있어 보험 가입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대응을 각각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으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을 포함해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실업급여도 그렇다. 실업급여의 역할은 무엇보다 실업시기에도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유무와 급여 수준은 실업자의 탈상품화 정도와 직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급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는 어느 정부에서나 반복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실업급여 사각지대(비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부정행위, 혹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목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째, 급여 신청 과정에서 수행할 조건이 더 많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더 잦은 조사,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건 부과의 강화는 제도 합리성과 관계가 있다기보다 재정 축소나 통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까다로운 신청 방식이나 이행 조건 때문에 정작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급여 생활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형성해 수급자의 급여가 낮은 것이 적정하다고 여기게끔 한다.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효용이 떨어지고, 급여 생활자는 낙인을 경험하거나 위축된다. 현재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낮은 급여 수준이 끊임없이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개악은 사회안전망 해체 시도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업급여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전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정당하지 않고, 후자는 정당하다는 식의 인식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실은 사회보험의 뿌리인 보편성을 뒤흔든다.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경로는 여러 사회와 제도에서 비슷하게 반복된다. 사회보장제도를 소수만을 위한 것처럼 꾸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은 열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급여 수준이 열악해지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 제도의 의미가 퇴색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축소, 폐지 의견이 우세해지고,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무너져가면 개인들은 시장에 훨씬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할 생애 전반 비용은 높아지고, 더 불안정해 진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취임사에서부터 서른다섯 번 외친 ‘자유’, ‘공공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선진화’ 등 사례를 다 꼽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나 시장 맹신론자 대통령 때문에 실업급여가 개악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진실의 절반만을 보여준다. 실업급여의 후퇴를 가장 기대하는 이들은 더 저렴한 임금, 열악한 조건을 노동자들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득을 보는 쪽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익에 발맞춰 정부는 단기 고용,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장이 아니라 실업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실업급여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선동은 조선일보에게마저 비판을 받는 처지였지만, 실제 실업급여가 개악되고 나면 이 순간을 말장난으로 기억하긴 어려워질 것이다. 공적 영역이 껍데기만 남게 될 때 우리는 더이상 사회와 공동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쟁, 끊어진 연대, 타인에 대한 비관용,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우울한 우리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결과가 아닌가.
불안과 냉소를 오갈 수는 없다. 아직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갈 길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글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a href="https://platformc.kr/join/"><img src="https://cdn.sanity.io/images/u0qigokj/production/5bd69c46212be7c60543b3e2f40023d410c7bc80-700x73.png?w=700&q=80"></a><br><p><font color="ababab" size="2.2" align="center">플랫폼c 회원활동 또는 후원을 통해 사회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br>※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203-964648 플랫폼씨</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