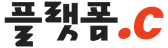용산다크투어 후기
용산 참사로부터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13주기를 맞아 기획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다. 용산역에서 출발해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 걸으며 가이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의 통로를 탐방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함께 걷는 길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함께 보이는 듯했다. 지난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용산 일대에서 자본의 욕망이 벌인 일들이 압축된 풍경으로 남아 있었다.
투어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했다. 시청역 광장과 달리 용산역 광장은 서울 시민의 공간이 아니다. 민자화를 통해 이렇게 사유지가 된 공공장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용산역 구름다리를 지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만치 구석에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를 홈리스 텐트촌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다. 삶의 거처를 잃은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

이촌 고가교에 오르자 논란의 정점에 있는 용산 정비창이 한눈에 보였다. 수십 년간 철도 차량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곳으로 쓰이다 모두 철거되고, 한국철도공사와 민간 출자사가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오랜 세월 동안 허허벌판 상태로 방치되어 온 땅. 2005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무산되어 온 이 땅이 작년부터 다시금 투기 개발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고 한다.
펜스 너머로 오십만 제곱미터의 텅 빈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땅이란 뭘까? 흙과 먼지에 불과한 땅이 누군가에게는 금싸라기 개발 부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삶의 터전일 것이다. 고 권정생 선생의 오랜 시구를 빌면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되는 것이 땅이겠지만, 이제 우린 부동산과 개발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땅에 관해 말할 수가 없다.

정비창 부지 후문을 지나 마지막 장소인 용산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국화꽃을 한 송이씩 모으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13년 전 참사가 일어난 남일당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3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서 있다. 바닥에 내려둔 국화꽃 위로 그늘이 길게 졌다. 매끈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이 새삼 황량하고 초라해 보였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도시가 아닌, 투기를 위해 허물고 부수는 도시가 아닌, 살기 위한 도시, 함께 머무는 도시를 우리는 꿈꿔야 한다. 용산다크투어를 주최한 용용단(용산정비창 공동대책위원회)은 실패한 오세훈표 투기 개발의 반복을 막고 정비창 부지에 시민을 위한 100퍼센트 공공주택을 짓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과오를 딛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지혜가 이 도시에 절실히 필요하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모나미 153 연대기』의 한 페이지를 들춰봤다. 모나미 볼펜의 (가짜)역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이 소설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 2009년에 쓰였다. 소설 중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조세희 작가는 철거촌에서 주민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철거반원들에 대항해 싸운 뒤, 모나미 볼펜을 사서 난쏘공의 초고를 썼노라고 회고했다. 용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어지는 대목을 옮겨 적어본다.


볼펜 한 자루로 시작했지만 이 소설은 30년에 걸쳐 백만 부 이상 출판되었고 유명한 학생필독도서가 되었다. 그런데 세 차례 강산이 바뀌고 백만 명의 독자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했다. 작가 스스로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사실인데, 난쟁이가 그 후 도무지 늙지를 않는다는 사실이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은 아직까지 기나긴 굴뚝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한 채 검댕 속을 맴돌고 있고, 소설 속 영희와 영호는 계속해서 똑같은 대화를 되풀이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화.
“중요한 건 현재야.” 영호의 말이었다.
“큰 오빠.” 영희는 말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지?”
“뭐라구?”
“그들의 백육십 년 전 상태에 가까워,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 가까워?”
뫼비우스의 띠처럼 시간의 회로가 어디선가부터 꼬여버린 것이 아니라면, 인류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대한 차원의 데자뷔를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역사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쓴다는 행위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문학적 비극이기도 하다.
조세희 작가는 이 소설로 제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모나미 볼펜은 그 이름에 걸맞게도 문학의 오랜 친구라는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예술참여문구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도시의 틈바구니에 숨겨진 철거 지역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모나미 볼펜은 고통스러웠다. 급기야 2009년 1월 용산 시위 현장에서 철거민 다섯 명이 목숨을 잃던 날, 모나미 볼펜은 자신의 몸을 분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볼펜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한 것이, 제 몸으로 한 번 써낸 끔찍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다시 쓰는 환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야말로 거부하고 싶은 고통 중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낱 문구용품에게 감당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 아닐까? (『모나미 153 연대기』 p.93~95)
김영글 (미술작가)
- 후원/가입으로 플랫폼씨 활동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셔요! 클릭!
- 일시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3-964648 플랫폼씨